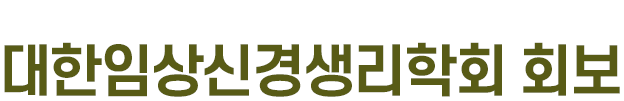중증근무력증의 중증도와 말초혈액 및 흉선에서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 발현의 연관성
김승우
연세세브란스병원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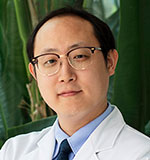
1. 중증근무력증에서 B세포의 중요성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근육접합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중증근무력증환자의 약 80% 정도에서는 항-아세틸콜린수용체 항체(anti-acetylcholine receptor antibody, AChR Ab)가 관찰되며, AChR Ab는 중증근무력증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과거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중증근무력증에서 자가항체의 존재는 중증근무력증의 병태생리에 B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증근무력증환자의 혈액에서는 아세틸콜린수용체에 반응하는 B세포가 존재함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흉선은 중증근무력증 병태생리의 한 축을 담당하며,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흉선에서는 흉선비대(thymic hyperplasia), 흉선종 (thymoma) 등 다양한 병리 소견이 관찰된다. 중증근무력증환자 중 일부에서는 흉선비대와 함께 ectopic germinal center가 관찰된다. Germinal center는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B세포가 somatic hypermutation, affinity maturation, clonal expansion 등의 과정을 통해 분화 및 증식하는 곳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중증근무력증환자 흉선의 germinal center에 존재하는 B세포들이 아세틸콜린수용체에 반응함이 확인되었다.
2. B세포 고갈치료의 대안으로서 Btk 억제제의 개발
위와 같이 중증근무력증에서 말초혈액 및 흉선에 존재하는 B세포는 질병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증근무력증환자에서 B세포를 억제시킬 경우 자가항체의 생성을 줄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에서 rituximab 등 B세포를 고갈(depletion)시키는 치료가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음이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rituximab의 경우 B세포를 고갈시켜 감염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BeatMG 등의 최근 연구에서는 rituximab이 중증근무력증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일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B세포 고갈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치료 중의 하나가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ruton‘s tyrosine kinase, Btk) 억제제이다.
Btk는 주로 B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티로신인산화효소(tyrosine kinase)로 B세포의 성장, 분화, 증식과 관련된 신호전달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Btk를 억제할 경우 B세포의 성숙이 pre-B세포 단계에서 멈춤으로써 B세포와 관련된 체액성면역이 억제된다. 실제로 Btk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성숙 B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X-linked agammaglobulinemia)에 이환된다. 반대로 Btk를 과발현시킨 마우스모델에서는 자가항체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3. Btk 억제제를 사용한 최근 연구 흐름
최근 Btk 억제제를 사용하여 B세포가 연관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와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의 동물모델에서는 Btk 억제제가 germinal center에서 형질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화된 B세포의 응집을 제한하며 자가항체의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발성경화증의 동물모델에서도 연수막(leptomeninges)에 침윤된 B세포에 Btk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발성경화증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B세포에 인산화된(활성화된) Btk의 비율이 정상인 대비 증가하였고,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뇌 조직을 면역염색하였을 때 미세아교세포(microglia)에서 Btk가 관찰되었고, 병변 주변에서 Btk의 발현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다발성경화증에서 Btk 억제제의 효과를 관찰한 무작위대조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조영증강되는 뇌병변을 감소시키는 등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 비록 최근 일부 Btk 억제제의 유효성을 평가한 phase 3 clinical trial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Btk 억제제에 대해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4. 이번 연구의 계기
최근 Btk 억제제를 이용하여 중증근무력증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발성경화증 등 기존 연구에서는 말초혈액 및 표적장기(target organ)에서 Btk의 과발현을 확인하고, Btk의 발현 정도와 질병의 중증도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반면, 중증근무력증에서는 Btk의 발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증근무력증환자의 혈액 및 흉선에서 Btk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고, 중증근무력증의 중증도와 Btk 발현 정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그 동안 연구 목적으로 모아 둔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흉선과 말초 혈액 단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연구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다만 Btk에 대한 면역조직염색과 유세포분석 실험 과정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연구비가 필요하였다. 감사하게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의 2024년 젊은 연구자를 위한 학술연구비에 응모한 것이 선정되어 “중증근무력증의 중증도와 말초혈액 및 흉선에서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 발현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